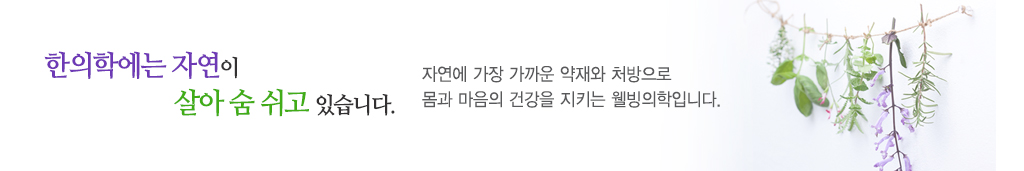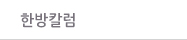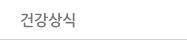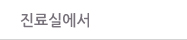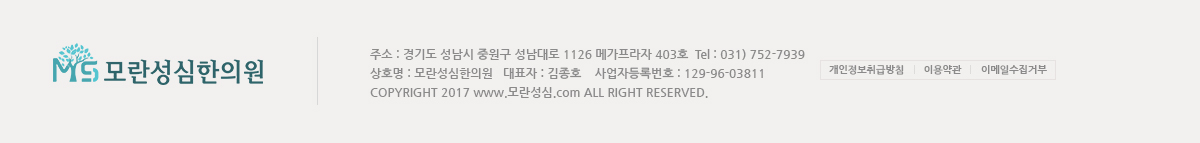딸부자
페이지 정보

본문
| |||
|
작성자 : 모란성심 … (61.77.227.168) 연락처 : 이메일 : house747@empal.com 날짜 : 03-06-16 14:26 조회 : 1374 |
모란성심 한의원. ****************************************************************************************** 딸부자 가냘프고 바싹 마른 할머니가 한 분 오셨다.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다. 우선은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등이 쑤신다고 한다. 어디 한 구석 안아픈 곳이 없다는 기색이다. 기와 혈이 다 허한 형편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도 그럴 것이라고 한다. 자그마치 9남매를 낳아서 길렀다고 한다. 외모로 보아서는 일흔을 훌쩍 넘기셨을 것 같은데 설을 쇠야 예순 일곱이라고 하니 나이보다도 오륙년은 더 늙어 보이는 셈이다. 그도 여인인지라 나이 들어 보인다니까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애들 키우느라고 어디 제 나이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을 한다. 9남매를 낳으시느라, 먹이시느라, 키우시느라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으리라. 그녀는 정확하게 말하면 8녀 1남의 어머니다. 손이 귀하디 귀한 집안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 손을 이어보려고 남들에게 눈치 보이는 것을 마다하고 20년 동안 출산을 계속해서 드디어 막내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애시당초 손이 귀한 집안이라 영감은 9살 때 8촌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다. 호적으로는 아예 그 집에서 출생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있다. 호적상으로는 간신히 7대 독자의 맥을 잇고 있었던 것이다. 영감이 양자로 들어간 후 7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영감이 열 여섯 살, 박씨 할머니가 열 일곱 살 나던 해에 혼례를 치루었다. 그 때 당시에 시아버지가 벌써 일흔 여섯, 시어머니는 호호백발인 여든이셨다. 당시로 치면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벌도 훨씬 더 지난 연배이셨다. 일이 꼬이느라고 그랬는지 박씨도 결혼 한 후 내리 2년 터울로 딸 둘을 낳게 되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들을 낳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었다. 낳은 지 2 주가 지난 둘째 딸을 한 번 안아보고 신랑은 군인을 가게 된 것이다. 그 때 신랑의 나이가 스물 둘이었다. 딸만 내리 둘을 낳아서 새 색시 입장에서는 민망하기 짝이 없었는데, 시아버지는 워낙 손이 귀했었던 터라 오히려 손녀딸에게도 지극히 정성을 쏟으셨다. 딸 낳은 어미 입장이 민망할 정도로 금쪽 같이 위해주었다고 한다. 며느리 사랑도 어찌나 대단 하셨는지 모른다. 나이로 치면 막내 손주 며느리 뻘 밖에 안되는 어린 며느리가 안스러워 보이시기도 했을 것이다. 열 일곱에 시집온 새댁이 무슨 솜씨가 있었을 것이며 손맛이 어찌 제대로 날 것이며, 집에 있는 재료란 게 또 뭐 그리 별 것이 있었겠는가. 감자 몇 덩이에 대 파나 고추 등으로 얼기설기 섞어서 된장 풀어서 끓여 내는데도 음식이 너무 맛있고 고맙다고 끼니때마다 치사를 하셨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병약하셔서 제대로 수발다운 수발을 받을 수가 없었던 이유도 한 몫 했었을 것이다. 깡보리밥이지만 조금이라도 물렁하게 해드리려고 밥이 다 익은 다음에도 한참을 더 푸욱 쪄서 정성껏 올려드렸다. 신랑이 군대 가던 해에 시아버지가 작고하셨다. 이 때부터 과부아닌 청상과부의 생활이 3년 동안 시작되었다. 갓난애를 들쳐업고 세살박이를 손에 끌고 밭에 나가 김을 매고, 논에 물을 대고,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고 밥을 앉히고 빨래를 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치매기를 보이기 시작한 호호백발 시어머니는 신랑이 군대간 3년간을 내리 제 정신을 잃고 살아서 젖먹이 어린아이 셋을 한꺼번에 돌보는 격이었다. 갓난아이 기저귀를 빨아내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싼 똥을 다시 치우면서 한 편으로 큰 딸아이와 작은 딸아이에게 번갈아가며 젖을 물렸다. 그 때 당시에 별다른 이유식이 없었으니 네댓살까지도 엄마 젖을 빨리던 시기였다.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집에서 하는 일들을 흉내라도 내야 했다. 요새 같지 않아서 대소사에 쓸 술을 집집마다 담아서 마련하던 때였다. 남들처럼 넉넉하게 할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술을 담는 흉내라도 내야 조상들에게 인사치레라도 할 수 있었다. 집안 일, 바깥 일,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녀 차지였다. 보리방아 쪄야지, 논에 모심어야지, 밭이랑 골라야지, 타작 해야지, 일이란 일이 숨쉴 틈도 없이 밀려들었다. 신랑이 제대한 후에도 일거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아들이 수발을 들자 잠시 정신을 차리는 듯하던 시어머니는 석 달 정도를 그나마 편하게 지내시다가 마음이 놓인다는 기색으로 시아버지 뒤를 따라 나섰다. 아마도 한꺼번에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는 강박관념이 치매를 일으키게 했고, 아들의 귀환이 노할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홀어멈 혼자서 3년 살림을 해내느라 여기저기 벌려놓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일을 더 늘릴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일하는 틈틈이 애는 잘 들어섰다. 임신한 몸으로도 논일, 밭일을 했다. 논일 밭일을 하면서 짬나는 대로 출산을 하는 격이었다. 천만다행인 것은 산모나 아기가 항상 건강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기는 항상 딸이었다. 딸을 낳을 때마다 그녀는 펑펑 울었다. 신랑은 그녀의 건강한 출산에 대해서 감사해했고, 이웃들은 위로해주었다. 하지만, 또 딸이라는 수근거림이 뒤를 이어 들려왔다. 그 것은 수모였고 치욕이었다. 7대 독자의 양자 며느리 자리로서는 할 일이 아니었다. 치욕을 잊고 수모를 견뎌내기 위해서 더더욱 임신하기에 힘썼다. 그렇게 배부른 몸으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딸을 낳기를 계속하기를 근 이십 년만에 하늘이 정녕 무심치 않아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9남매의 막내아들이었다. 없는 살림이라고는 하지만, 논뙈기 밭뙈기가 그나마 있었기에 심어먹고 붙여먹고 살아갈 수 있었기에 엄두를 낼 수 있었던 일이었고, 그녀와 신랑이 다같이 무던하고 건강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제 그 아들이 직장을 잡았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여섯째 딸도 대학에 편입을 했다. 시집간 딸들도 다들 잘 산다. 딸이 하도 많아서 누구를 공부시키고 누구를 못시켰는지도 기억이 아물아물하다. 어쨌든 공부를 못시킨 딸들은 못시킨대로, 대학을 마친 딸들은 대학을 마친대로 서로 서로 챙겨주며 잘들 산다. 올 한해 동안 아무 걱정없이 몸만 편안하면 더 바랄것이 없겠다. |
- 이전글10분이상 고민하지 마라 15.12.31
- 다음글드링크 할머니 15.12.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